1940년 송지향이 본 소백산 도솔봉은 숭엄하고 신비롭다
우리고장 우리마을 숨겨진보물을 찾아서[30]
송지향의 소백산탐승기(小白山探勝記) ①

턱미테서 본 도솔봉 정상(현재)
1940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소백산 탐승기
“소백산은 천혜의 성산(聖山)인 동시에 장엄과 신비의 극치”
풍기-전구-옥동-송림-별유천지-10리반석-도솔봉 정상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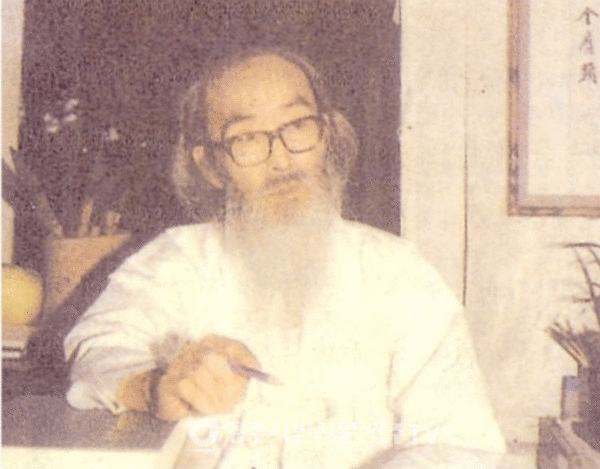
유계 송지향 선생 생전 모습
송지향은?
송지향(宋志香. 礪山人, 1918-2004, 호:幽溪)은 평북 박천 종달골 출신으로 1929년 12살 때 풍기로 옮겨 금계리에 정착했다. 1940년 조선일보 풍기지국을 운영할 때 ‘무슨 답사기’ ‘무슨 탐방기’ 등 다른 신문지국이 못하는 특종기사를 해서 송지향에 대한 인식이 차츰 달라지고 구독자도 늘어났다.
23살 청년 송지향은 탐사대(9명)를 조직하여 1940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소백산을 답사하고 ‘소백산탐승기’를 썼다. 그리고 그해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회에 걸쳐 조선일보 3면에 연재했다.
송지향은 당시 일기에 “커다란 제목 아래에 풍기지국 ‘송지향’이란 이름 석 자까지 실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살아간다는 일이 벅차고 두렵기만 하여 아무래도 잘못 태어난 운명인가 여겨왔는데, ‘잘만하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란 느낌이 들기도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 '소백산탐승기' -풍기지국 송지향
향토사학자 류창수(하망동) 선생은 “조선일보가 4면을 발행할 당시 ‘송지향의 소백산탐승기’를 1주일 동안 연재했다는 것은 중앙언론계에서 그의 문재(文才)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당대 영남의 으뜸 선비요, 교육자이면서 사학자였다”고 말했다.
본지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는 조선일보가 연재한 ‘송지향의 소백산탐승기’ 원본을 탐문 입수하여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송지향의 천재적 문학성과 타고난 표현력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탐승기는 당시 맞춤법에 따랐으며, 고어와 사투리는 원문 그대로 실었음을 밝힌다.
송지향이 본 소백산
송지향의 소백산탐승기는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라는데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된다. 「 」 안의 글은 기사 원문이다.
「풍기에서 서북쪽으로 죽령(竹嶺)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갈라선 소백산은 경상, 충청, 강원 삼도에 걸쳐 자리 잡고 엄숙히 진좌한 일대 산악으로서 그 장엄한 위용은 마치 이 지방의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보장하고 수호하려는 듯이 사방을 굽어보고 잇다.
소백산은 그 주위에서 자기의 품에 안기어 사는 수만 주민의 영원한 행복을 수호하여 주는 성악(聖岳)이며, 생활의 원천인 만큼 주민의 이 산에 대한 미듬은 진실로 크다. 소백산에 근원을 두고 사방으로 흐르는 수백 갈래의 게류는 언제나 넘쳐흘러서 삼백여리나 되는 큰수위에 연접해 잇는 수만흔 전답- 즉, 소백산의 동으로 영주, 남으로 예천, 서으로 단양, 북으로 영월 아래 모든 평야가 어느 것이나 다 이 소백산에서 흘으는 물로써 관개(灌漑)를 하는 거이니 이리하여 아모리 혹심한 한재가 잇더라도 주민을 살리고 남을만한 양식과 옷을 나누어 주며 무성한 삼림은 밥지을 연료부터 집지을 재목까지 되어주며 장엄 수려한 이 산의 정기를 바더 자라난 향기로운 천연생의 산채는 수천의 화전민의 일종의 자원이 되어주는 동시에 또한 그들의 구미를 도두어주는 등 실로 그들의 생활의 어느 하나가 소백영산이 주는 천혜의 은택이 아님이 업다.
소백산은 이러케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여러 가지의 물질적 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성산(聖山)인 동시에 장엄하고도 수려한 산악의 기이한 뿌리와 수업는 게곡에는 장엄과 신비의 극치라고 할만한 조물주의 예술적 물품이 그대로 비장되어 가고 천여년전의 옛꿈을 품은 신라시대의 유서기픈 사찰이 오륙처나 잇어서 알뜰히 캐고 뒤지어 차즈면 이끼 안즌 개와ㅅ장이며 지추돌인들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히 달고 쓴 옛꿈을 이야기하고 걸어온 길을 일러주리요만 눈이 어두운 범부속한이 애써 알랴느이업스니 이어찌 통탄치안흐랴-」라고 썼다.

도솔계곡의 일부=1940.6.19. 송지향 촬영
소백산 탐승을 시작하며…
송지향은 소백산 답사길에 오르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필자는 느낀바잇어 십여 동지를 어더서 다단한 세연에 얽히인 몸이 업는 틈을 내어 오륙일간의 시일을 써가며 소백성산을 근참하고 비장된 처녀경을 차저보는 광영을 엇고자함이엿다. 천고의 비경을 탐승하는 영예를 가진 필자만이 소백산의 진용을 아는 것은 너무나 과분한 듯하여 비재천학임을 돌보지 안코 소감의 일부분이나마 지면을 통하여 강호에 알리려 하니 독자 제씨는 필자의 이 뜻을 참작하고 조잡한 글을 용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소백산 순례 장도에 오르다
풍기를 출발하여 옥동-송림을 거쳐 도솔계곡을 오르면서 그 장엄한 비경을 이렇게 적었다.
「유월십구일 오전 오시(五時)-미리부터 조직되엇던 단원 십일명 중에서 의외의 장애로해서 두분이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 남저지 전대원 구명이 똑가튼 차림으로 간단한 등산복장을 하고 기세조케 씩씩한 기상으로 소백산영산 순례의 장도에 오르게 되엇다. 노인봉 허리로부터 올러 솟는해ㅅ발이 오랜 가물로 후덥덥한 공기에 싸힌 삼라만상을 선명하게 비추어 주는 아침 즐펀한 평야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전구’의 울창한 느티나무 숩풀 지나서 감나무 밤나무가 가득 들어선 속에 새뜻한 농가들이 보기조케 들어선 옥동(玉洞)이란 마을에 이르니 소를 몰고 일터로가는 농부의 희파람소리가 드노픈 느즌 아침 하늘에 날러온 마을을 지나서부터는 송림이 무성한 속으로 초부의 나무하러 다니는 길인듯한 경사진 호젓한길이 시작된다.
한 산구비를 지나서 송림이 다하는 곳에 넓슥한 동천이 눈압페 전개되며 구확을 스처흐르는 우렁찬 목소리는 만장홍진속에 시달리는 우리 일행의 마음과 몸을 씨처주는 듯 상쾌함을 느끼며 또한 반가웁게 들려온다. 다리를 잠간 쉬려고 미풍에 춤추는 녹음이더핀 바위우에 몸을 실으니 속새의 진애와 잡념이 깨끗이 씨처주는듯 몸과 마음이 한가지로 가벼워 진다.」

1940년 7월4일자 조선일보 3면
도솔계곡의 절경을 보다
송지향은 도솔봉 정상을 바라보며 “너무도 신비스럽고 숭고한 위용에 자연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두 손을 쥐었다”며 그 풍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반공(半空)에 우뚝소사 창창히 하늘을 찌를 듯 단애절벽으로 된 도솔봉 절경이 바로 눈아페 소삿고 허리에 구름이 둘러잇는 영봉이 해ㅅ살을 바더서 유난히도 빗나는 그 웅자- 너무도 신비스러웁고 장엄하며 또 숭고한 위용에 경건한 마음이 자연 일어나서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공손이 두손을 모아쥐엇다. 여기서부터는 좌편에 시냇물을 끼고 힌돌과 맑은 물이 서로 다투는 경개를 백길아래로 굽어보며 점점 경사가 심해가는 양장석로를 오르게 되엇다. 절경! 절경! 하고 세상 사람이 절승한 경개를 비겨 말할제 ‘그림폭’에 비한다. 필자 역시 별유천지의 절승을 무엇에 비할까 하고 찻다가 얼핏 산수화(山水畵)를 연상해 보앗스나 이 위대한 조물주의 묘기를 한폭 산수화에 비한다는 것은 이 성지영경에 대하여 당치안흔 말인듯하여 다-만 도솔게곡 그대로 보리라하엿다. 이 게곡의 특색은 십여리 장게의 바닥이 한덩이 반석으로 연해 깔려잇는 것이다. 유수한 수풀이 창울한 속으로 맑은 물결이 혹은 바위를 싸고 내다르며 혹은 푸른 못으로 변하고 혹은 폭포가 되어 굽이굽이 흘러내려서 저-이름모를 새소리와 함께 산영수색이 정히 사파의 번뇌를 씨처주는 듯한 경개에 도취되어 피로한줄도 모르고 경쾌한 거름을 옮겨놋는 동안에 어느듯 도솔봉 턱미테 다달앗다. 고개를 바짝 뒤으로 제끼니 아! 아! 한 영봉이 하늘에 다은듯하엿다. 게속」 -1940.7.4. 목-
도솔봉 정상 턱미테
송지향은 도솔봉 정상 주변의 풍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도솔봉 턱미테 다달은 일행은 넓즉한 반석에 걸터안저 돌 사이로 이리저리 부디처 흐르는 말근 물에 발을 잠그고 고개를 돌려서 바로 눈아페 소슨 도솔봉 절정을 치어다 보앗다.
깍아 세운듯한 절벽으로된 놉고나즌 산봉우리들이 좌우로 우둑우둑센 가운데 엄연히 올라안저서 우리를 굽어보는 듯한 도솔봉은 볼수록 숭엄하고 신비스러웁다. 일흠모를 덩굴이 바위우를 휘감고 군데군데 천야만야한 절벽 끄테 위태한 듯이 서잇는 허리굽은 노송과 못(釘)을 거꾸로 꼬자노은 듯 꼭댁이에만 몇가지씩 부튼 아름두리 늙은 젓나무- 이따금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활개를 벌려너울너울 흥겨워 춤을 추는데 맞추어 물소리 새소리가 어울리어 신선의음악 알외는 듯 이것은 도솔 영봉을 위하여 조물주가 온갖 정성 온갖 기교를 다하여 베풀어 주신 영원불멸의 자연의 시(詩)요 그림이다. 이 성지 영경(靈境)의 풀 한포기 흙한줌 돌한덩인들 조화의 신비 아님이 업거니 우리 따위 세속 사람이야 자취조차 남기기 송구하다. 이제부터는 도솔봉의 정면을 향하여 올라오던 길을 좌편으로 꺽어 흐르는 물을 건너서 도솔봉의 측변을 안고 돌아올라 가게 되엇다. 여기서부터는 머루다래 넝쿨이 엉킨 잡목나무가 한층더 무성하고 길은 더욱 급경사가 저서 아페가는 이의 발굽치가 뒤ㅅ사람의 이마우에 다으리만큼된 비탈인데다가 더욱이 몃천년 몃만년을 두고 나려깔린 낙엽이 썩고 깔리고하여 길을 찻기 곤란하다.」
-다음호에 계속-
이원식 기자 lwss0410@hanmail.net